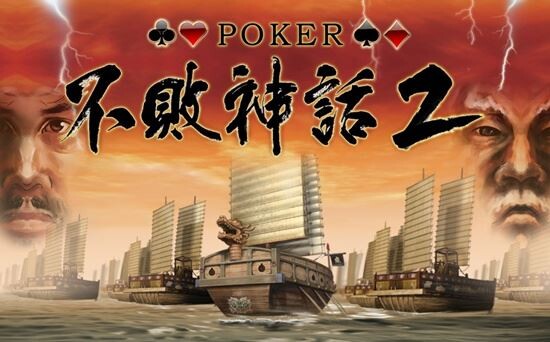
이순신 장군은 주역과 척자점(擲字占)의 고수였고, 점의 효험을 찬탄했다.
난중일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점을 친 기록이 17번이나 나온다. 그 중에 14번은 자신이 직접 착지점을 친 것이고, 나머지 3회 중 2회는 맹인 점술가 임춘경이 이순신의 점을 봐 준 것이고, 1회는 점쟁이 신홍수가 원균의 주역점을 보았다고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전쟁터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라, 장수가 조금이라도 두려운 기색을 보이면, 밑에 군졸 들은 도망갈 궁리부터 하는 법이다. 그래서 장수는 자신의 패를 남에게 읽히지 않는 게 중요하다. 충무공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부하에게 보이지 않게 새벽에 홀로 점을 쳤을지 모르겠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점을 친 내용 중 유성룡에 대한 점의 일부를 보자..
(1594년 7월 13일) 홀로 앉아 류성룡 재상의 앞날을 점쳐보니 바다에서 배를 얻는 괘(如海得船之卦)를 얻었다. 다시 점치니 의심한 일이 기쁨을 얻는다는 괘(再占 得如疑得喜之卦) 이니 길하고 길하다. 이렇듯 장군은 자신의 연줄이자 뒷배인 류성룡의 건강, 정치적 미래를 걱정하여 자주 점을 쳤다고 한다,
(1594년 9월 1일) 아침 일찍 아내 병세를 점쳤더니 중이 환속하는(如僧還俗)는 괘다. 다시 병세가 차도가 있음을 알려올지 점을 쳐보니 귀양 가서 친지를 만나는 괘(如謫見親之卦)다. 오늘 기쁜 소식을 들을 징조다.
(1594년 9월 28일), 새벽에 홀로 왜적을 치는 일이 길한지 점을 쳤다. 첫 점괘는 '활이 화살을 얻은 것과 같다(如弓得箭)'는 괘다. 다시 점을 치니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如山不動)'고 나왔다.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여 흉도(胸島)안바다에 진을 치고서 잤다.
장군은 전통 주역점(周易占)보다 (소강)척자점 (擲字占)을 선호했고, 특히 전투를 앞두고는 이 점을 많이 쳤다. 척자점은 주역점의 주사위와 달리 윷을 던져 괘를 뽑는다. 도가 나오면 (1), 개가 나오면 (2), 걸이 나오면 (3), 윷&모(4)로 하여, 세번 던져 나온 숫자가 괘다(모를 4번으로 하기도하고, 모가 나오면 한 번 더 던진다).
예를 들면, 장군이 (1594년 9월 28일)에 뽑은 첫 점괘는 개도걸(213)로, 활이 화살을 얻은 것과 같다(如弓得箭). 두번째는 걸걸개(332), 산이 움직이지 않는(如山不動)이다.
장군의 개인적인 사주는 또박 또박한 경오일주에다가 투기적 모험을 싫어하는 정재격이다. 이런 사주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모험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쟁에만 출전하는 스타일이다.

한방을 기대하고 모험하는 편재나 편관에 비하여, 정재격과 정관을 차고 있는 이순신은 모험 회피형 사주다(모험적 승부사인 편재나 편관에 비하여, 정재는 적게 먹고 안전하길 바란다).
위험회피 정재와 안전 추구 정관 사주인 충무공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컸을 것이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홀로 점을 치면서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다독거렸는지 모른다.

|
그 외 원균에 관한 주역점(周易占)을 봐 준 것은 원균이 걱정되고 이뻐서가 아니라 하도 장군을 빡치게 하니 일부러 본 듯 해보인다.(이 좌식 언제 죽을까 좀 보자)^^ 실제로 난중일기에도 나오지만 전쟁이 후반기로 가면 갈 수록 이순신이 원균에겐 심하게 말하고(맘에 안들 때 대하는 태도 같은) 때론 선조에게 직접 "원균 이좌식 진짜 안되겠다. 손 좀 볼테니 모른척 해달라"는 식의 상소를 여러차례 올리기도 한 건 사실이다.
사실 공자도 점쟁이었다. 이순신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유명한 위인들 중에 여러 위인들이 점을 보는 걸 즐겼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직접 점을 볼 줄 아는 점쟁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큰 위기 때 마다 이순신 장군 꿈에는 자꾸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알려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 사주가 신약 사주라는 말도 있던데, 만약 진짜 신약 사주에 그런 일을 해낸거면 정말 그의 애국정신, 호국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새삼 느끼게 된다.